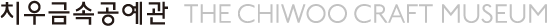[2018.02 치우뉴스레터] 공예관 소식1
목록보기
–
[추도의 글 전문]
그리운 유리지 선생님
어느덧 가신 뒤 다섯 번 바뀐 우수날입니다.
세월의 부지런이
마치 눈 속의 매화 같습니다.
기약 없이 떠나가신 선생님
귀뚜라미 우는 밤, 반달마저
구름 속에 숨어들었습니다.
귀촉도 동창에 하늘소리
구슬프게 울어 대던 밤에는
따라 울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 님은 갔지마는
나는 임을 보내지 아니 하였습니다.’
<님의 침묵>에서 빌려봅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김소월의 글로 불러봅니다.
다섯해 전 그렇게도 서둘러
하얀 은사시 끝가지로
하얀 구름 얼굴로 가셨습니다.
하얀 장미 싱그런 미소도
은근과 절제로 빚었던 혼들
피의 인연, 정의 인연
모두 그냥 두고 가셨습니다.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들 하는데
아직은 할 일이 너무 많아 못 간다는데
아모르 파티 입니까?
선생은 정녕 깊은 계곡과 동그란 호수가 있는
백장미 흐드러지고
백목련, 하얀 벚꽃 만발한 파라다이스
아버님 찾아
효성으로 가신 길 이었습니다.
돌이켜 봅니다.
선생은 아무도 가려하지 않던 길
선뜻 몸을 던진 퍼스트 펭귄이셨습니다.
여자의 길, 내던지고
태평양 망망대해 건너가
불대로 쇠 녹이고, 망치로 펴고…
「아름다운 삶의 한 형식」에서도
쇠·나무·돌 가림 없이
‘죽음은 삶의 가장 깊은 곳’이라 死의 讚美로 녹여내셨습니다.
한국 금속공예 전용 전시관
긴요하다며 꿋꿋하게 황소처럼
큰 획을 그리셨습니다.
진정한 스승이셨습니다.
인간됨이 먼저라며
예의범절 까지도 서당 훈장처럼 꼿꼿하신
큰 마중물로 로망이셨습니다.
언제던가요?
방배동 작업실 이층으로
퇴근길 어스름한데
문 여는 순간 난데없이 새까만 복면이
억세게 잡아채며 시퍼런 칼 데미는 순간
까무러칠 법도 한데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떠올리며 바닥에 설치해둔 방범벨 스위치
가냘픈 발 쭉 뻗어 밟았었습니다.
온 건물 요란하게 벨소리 울리고
복면은 줄행랑 쳤고
그제서야 선생은 바람 빠지는 튜브처럼
주저 앉았었다지요.
그 일이 계기 였던가요?
우리집 화순이 딸 데려가 도리로 키웠습니다.
천생연분이었습니다.
도리는 유명했습니다.
선생의 그림자로 충견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리도 선생 곁으로 갔다지요?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어쩔 수 없으셨나요.
백목련 조만간 봄을 일으킬텐데…
루비콘을 건너고 마셨습니다.
화용월태(花容月態)하고
요조숙녀(窈窕淑女)로
물고기는 물속 깊이 숨고
기러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다뉴브강의 잔 물결」에 새 옷 입혀
불러봅니다.
오던 구름 멈출 수 없고
가던 바람 돌아설 수 없으니
어찌 하오리요.
티 한 점 없는 순수함이여
깔끔함이여 그대는
한송이 하얀 장미꽃이셨습니다.
2018년 2월 19일
윤여옥